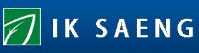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 원인과 증상 |
옹(癰)은 체표(體表)와 장부(臟腑)가 곪는 것임. 외옹(外癰)은 체표에 생기고 내옹(內癰)은 장부에 생기며 각기 폐옹(肺癰), 간옹(肝癰), 장옹(臟癰), 위완옹(胃脘癰), 신옹(腎癰)으로 나뉨. 저(疽)는 헌데가 깊고 잘 낫지 않는 것임. 부위에 따라 음저와 발저, 증상에 따라 유두저(有頭疽)와 무두저(無頭疽)로 나눔. 내인옹저(內因癰疽)는 칠정온결(七情蘊結), 조심과도(操心過度), 고량후미(膏梁厚味)로 장부가 훈증되거나 성교 등으로 원기(元氣)가 휴손되어 생김. 외인옹저(外因癰疽)는 육음(六淫)이 침습하거나, 여름에 밖에서 자거나 습지(濕地)에 앉거나 누워 풍한(風寒)이 경락(經絡)에 침습하여 생김. 내인옹저는 귀하게 자랐거나 비만한 사람에게 생기기 쉽고, 헌데가 딴딴하고 뿌리가 깊으며, 편평하고 고름이 없으며, 표실이허(表實裏虛)로 독이 나오기 어려움. 외인옹저는 대개 옴이 약하고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앓기 쉽고, 한열(寒熱)이 오가며, 근골(筋骨)이 쑤셔서 걷기가 힘들고, 습담(濕痰)이 유주(流注)하여 탄탄(癱瘓)이나 구안와사(口眼喎斜) 등이 나타남. |
 옹저(癰疽)
옹저(癰疽)
 옹저(癰疽)
옹저(癰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