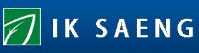이롱·난청(耳聾·難聽) / 이비인후과 계통
익생처방관련 약초
구롱(久聾)
노롱(勞聾)
농외(聾聵)
신수부족(腎水不足)
신허이롱(腎虛耳聾)
이롱(耳聾)
졸롱(卒聾)
졸이롱(卒耳聾)
풍롱(風聾)
익생원인과 증상
이롱이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병증이고, 난청은 청력(聽力)이 저하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병증이다. 다만 동의 고전에는 귀가 먹어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롱무문(耳聾無聞),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을 이롱이라고도 하였다. 이롱 및 난청의 원인은 다양하여 귀를 후비거나 사고로 귀를 다친 경우, 고열이나 홍역·성홍열 등의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생겨 속귀(內耳)까지 장애가 발생하여 심한 난청이 되는 경우,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거나 듣기가 어려운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전음성난청(傳音性難聽) : 바깥귀에서 가운뎃귀 사이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그 장애가 바깥귀에서 가운뎃귀까지가 고작이어서 증상이 비교적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므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감음성난청(感音性難聽) : 속귀에서 뇌 사이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거나 듣기 어려운 경우이다.
 구롱(久聾)
구롱(久聾)
| 계통 |
귀(耳)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오랜 난청. 인체의 정명(精明)한 기의 대부분이 이규(耳竅)를 지나 청각이 생기므로, 이 중에서 한 경락이라도 허실(虛失)이나 실조(失調)가 발생하면 청각장애가 일어남. 귀가 잘 안 들리고 몸이 약하면 정기(精氣)가 부족한 것으로서 허증(虛證)이고, 몸이 건장한데 잘 들리지 않으면 정기가 폐색(閉塞)된 것임. 또 큰소리나 경기(驚氣)를 감촉하여 간담(肝膽)이 응할 때 담맥(膽脈)이 귀를 얽매면 그 풍화(風火)가 진동해 이규를 막음. 또 심신(心腎)이 허하면 간화(肝火)가 항역(亢逆)해 내풍(內風)이 생겨 이규를 덮어서 발생함. 두현목훈(頭眩目暈), 요슬산연(腰膝痠軟), 이명(耳鳴)이 따름. |
| 참고 |
의방유취(醫方類聚) |
| 질병처방 |
감수(甘遂)[1]
|
|
귀뇨(龜尿)[1]
|
|
서담(鼠膽)
|
|
여생지(驢生脂)
|
|
자석(磁石)[2]
|
 노롱(勞聾)
노롱(勞聾)
| 계통 |
귀(耳)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이롱(耳聾)의 하나. 기혈부족(氣血不足)으로 생긴 난청. 귀가 잘 안 들리고 울리며, 허리와 무릎이 저리고, 기운이 없고 피로하며, 꿈이 많고, 뺨이 붉고, 손·발바닥에 열감(熱感)을 느낌. |
| 질병처방 |
보골지환(補骨脂丸)
|
|
소신산(燒腎散)
|
 농외(聾聵)
농외(聾聵)
| 계통 |
귀(耳)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1) 날 때부터의 귀머거리. (2) 이롱(耳聾). |
| 질병처방 |
색이단(塞耳丹)
|
 신수부족(腎水不足)
신수부족(腎水不足)
| 계통 |
신장(腎臟)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신음부족(腎陰不足). 신음허(腎陰虛). 하원휴손(下元虧損). 신허(腎虛)의 하나. 색욕과도, 노권내상(勞倦內傷), 오랜 병으로 신정(腎精)이 지나치게 소모되어 일어남. 요산피로(腰酸疲勞), 두훈(頭暈), 이명(耳鳴), 유정(遺精), 조루(早漏), 구건인통(口乾咽痛), 양관조홍(兩顴潮紅), 오심번열(五心煩熱), 또는 오후 조열(潮熱) 등이 있음. 혀는 홍색을 띠고 설태는 없으며, 맥은 세(細)·삭(數)함. |
| 질병처방 |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
|
 신허이롱(腎虛耳聾)
신허이롱(腎虛耳聾)
| 계통 |
허로(虛勞)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신허이명(腎虛耳鳴). 신기(腎氣)가 허해 생긴 난청. 허약자나 노인에게 많음. 파도 소리나 매미 소리 같은 이명이 끊임없이 있으며, 밤에 잠들면 북치는 소리 같음. 수족이 당기고 아프며, 귀 안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나면서 가렵기도 하고, 입안이 마르고 번조(煩燥)하며, 손·발바닥에 열이 나고, 양쪽 척맥(尺脈)이 대(大)하거나, 또는 왼쪽맥이 허(虛)·대(大)함. |
| 질병처방 |
강갈산(薑蝎散)
|
|
구미안신환(九味安腎丸)[2]
|
|
익신산(益腎散)
|
|
자석(磁石)[1]
|
 이롱(耳聾)
이롱(耳聾)
| 계통 |
허리(腰)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이폐(耳閉). 농외(聾聵). (1) 난청. (2) 귀머거리.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허증(虛證)은 귀의 기능장애, 전신 장기계통의 병 때문이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기허(氣虛)·혈허(血虛)하거나, 늙어서 몸이 쇠약하고 정력이 부족해져서 생기며 두훈목현(頭暈目眩), 요슬산연(腰膝酸軟), 무력(無力), 이명(耳鳴)이 따름. 실증(實證)은 풍열(風熱), 풍한(風寒), 간화(肝火) 등으로 생기며 두통, 비색(鼻塞), 구고(口苦), 귓구멍의 폐쇄감, 이명이 따름. |
| 질병처방 |
감수산(甘遂散)[3]
|
|
개자(芥子)[2]
|
|
계향산(桂香散)[1]
|
|
구미안신환(九味安腎丸)[1]
|
|
구인즙(蚯蚓汁)[2]
|
|
냉보환(冷補丸)
|
|
만형자산(蔓荊子散)
|
|
복총탕(復聰湯)
|
|
비마자(蓖麻子)[1]
|
|
사고(蛇膏)
|
|
사향(麝香)[3]
|
|
삼선단(三仙丹)
|
|
생지황(生地黃)[4]
|
|
서각음자(犀角飮子)
|
|
시호총이탕(柴胡聰耳湯)
|
|
용담탕(龍膽湯)[1]
|
|
우슬모과탕(牛膝木瓜湯)
|
|
웅묘뇨(雄猫尿)
|
|
이어담(鯉魚膽)[2]
|
|
자석양신환(磁石羊腎丸)
|
|
자음지황탕(滋陰地黃湯)
|
|
창포(菖蒲)[2]
|
|
통신산(通神散)[2]
|
|
투철관법(透鐵關法)
|
|
파두(巴豆)[1]
|
|
형개연교탕(荊芥連翹湯)[1]
|
 졸롱(卒聾)
졸롱(卒聾)
| 계통 |
귀(耳)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폭롱(暴聾). 졸이롱(卒耳聾). 갑작스런 청력장애나 귀머거리가 되는 것. 신기(腎氣)가 허약한 데에 풍사(風邪)가 경락에 전입해 생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며, 현기증과 두통이 남. |
| 질병처방 |
투이통(透耳筒)
|
 졸이롱(卒耳聾)
졸이롱(卒耳聾)
 풍롱(風聾)
풍롱(風聾)
| 계통 |
귀(耳)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이롱(耳聾)에 풍을 낀 것. 귀의 경맥(經脈)이 허한 틈을 타고 풍사(風邪)가 들어가 경기(經氣)를 막아 일어남. 반드시 때때로 두통이 있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 안이 가려움. |
| 질병처방 |
궁귀음(芎歸飮)
|
|
궁지산(芎芷散)
|
 구롱(久聾)
구롱(久聾)
 노롱(勞聾)
노롱(勞聾)
 농외(聾聵)
농외(聾聵)
 신수부족(腎水不足)
신수부족(腎水不足)
 신허이롱(腎虛耳聾)
신허이롱(腎虛耳聾)
 이롱(耳聾)
이롱(耳聾)
 졸롱(卒聾)
졸롱(卒聾)
 졸이롱(卒耳聾)
졸이롱(卒耳聾)
 풍롱(風聾)
풍롱(風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