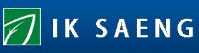소화불량(消化不良) / 소화기 계통
익생처방관련 약초
두부독(豆腐毒)
면독(麵毒)
면적(麵積)
비괴(痞塊)
비신구허(脾腎俱虛)
수곡불화(水穀不化)
숙식(宿食)
위기불화(胃氣不和)
육적(肉積)
음식불소(飮食不消)
적리(積痢)
치육중독(雉肉中毒)
한복통(寒腹痛)
흉격비민(胸膈痞悶)
익생원인과 증상
과음 과식, 부패물 섭취, 감염증, 피로 등에 의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소화가 안 되어 헛배가 부르고 트림이 나고 메스꺼우며 식욕부진·복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뒤따른다.
·식상(食傷) :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복통과 토사 등의 급성병변을 일으키는 증상.
·손설(飧泄) : 소화력이 약해서 먹는 대로 설사를 하는 병증. 젖을 뗀 후의 유아에게 많이 나타난다.
 두부독(豆腐毒)
두부독(豆腐毒)
| 계통 |
해독(解毒)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두부가 딴딴해지면 소화가 안됨. 노약자, 병약한 사람이나 아이들이 먹으면 좋지 않음. |
| 질병처방 |
해두부독일방(解豆腐毒一方)
|
 면독(麵毒)
면독(麵毒)
| 계통 |
해독(解毒)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밀가루 음식, 국수 등을 먹고 한사(寒邪)를 감수하거나, 비허(脾虛)로 동기(動氣)가 되어 운화가 안되어 일으킨 소화불량. |
| 질병처방 |
해면독일방(解麵毒一方)
|
 면적(麵積)
면적(麵積)
| 계통 |
내상(內傷)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식적(食積)의 하나.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한사(寒邪) 혹은 동기(動氣)로 비(脾)의 운화기능실조로 일어남. |
| 참고 |
동의보감(東醫寶鑑) |
| 질병처방 |
오매(烏梅)[8]
|
 비괴(痞塊)
비괴(痞塊)
 비신구허(脾腎俱虛)
비신구허(脾腎俱虛)
| 계통 |
허로(虛勞)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비신양허(脾腎陽虛). 신양(腎陽)의 부족, 명문화(命門火)의 쇠퇴로 비양(脾陽)의 실조(失調)를 일으켜 비와 신의 양기가 모두 허해진 것. 요산(腰酸), 슬랭(膝冷), 외한(畏寒), 음식불화(飮食不化), 소변불리(小便不利), 야간빈뇨, 부종, 오경설사(五更泄瀉) 등의 증상이 있음. |
| 질병처방 |
귤피전원(橘皮煎元)
|
|
윤신환(潤腎丸)
|
|
이신환(二神丸)[2]
|
|
천진원(天眞元)
|
 수곡불화(水穀不化)
수곡불화(水穀不化)
| 계통 |
내상(內傷)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섭취한 음식물이 전혀 소화되지 않는 것. |
| 질병처방 |
귤피기출환(橘皮枳朮丸)
|
 숙식(宿食)
숙식(宿食)
 위기불화(胃氣不和)
위기불화(胃氣不和)
| 계통 |
내상(內傷)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위불화(胃不和). 위가 음식을 수납하고 소화하는 기능이 실조(失調)한 병변. 위음(胃陰)이 부족하거나, 사열(邪熱)이 침범하거나, 위완부(胃脘部)의 식체(食滯)가 위기에 영향을 끼쳐 일어남. 음식이 싫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게 불러오며 메스껍고, 잠을 편히 못 자고, 대변이 고르지 못함. |
| 질병처방 |
해(蟹)[2]
|
 육적(肉積)
육적(肉積)
 음식불소(飮食不消)
음식불소(飮食不消)
| 계통 |
내상(內傷)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음식불화(飮食不化).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 비위(脾胃)의 수납·운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김. 먹은 음식물이 정체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그득하여 때때로 아픔. |
| 질병처방 |
전씨이공산(錢氏異功散)
|
 적리(積痢)
적리(積痢)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식체(食滯)로 생긴 이질. 배고파도 음식 생각이 없고, 배가 불어나고 그득하면서 아프고, 뒤가 묵직하며, 누렇거나 생선 창자 같은 변을 자주 봄. |
| 질병처방 |
감응원(感應元)
|
|
생숙음자(生熟飮子)
|
|
소감원(蘇感元)
|
 치육중독(雉肉中毒)
치육중독(雉肉中毒)
| 계통 |
해독(解毒)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꿩고기를 먹고 체한 것. 9~11월에만 먹을 수 있음. 다른 때에 먹으면 오치(五痔)가 나오고, 여러가지 창개(瘡疥)가 생김. 또 호도와 먹으면 두현심통(頭眩心痛)이 나고, 버섯 특히 목이버섯과 먹으면 오치하혈(五痔下血)이 있고, 메밀과 먹으면 비충(肥蟲)이 생김. 또한 꿩의 알을 파와 먹으면 촌백충(寸白蟲)이 생김. |
| 질병처방 |
해금육중독일방(解禽肉中毒一方)[2]
|
 한복통(寒腹痛)
한복통(寒腹痛)
| 계통 |
배(腹) / 외형편(外形篇) |
| 원인과 증상 |
한랭복통(寒冷腹痛). 감한복통(感寒腹痛).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거나, 또는 한사(寒邪)를 감수해 생김. 배가 계속 조금씩 아프고 증감이 없으나 차게 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더하며, 덥게 하거나 손으로 누르면 완화됨. 소변이 잦고 맑으며, 대변은 묽거나 설사하고, 설태는 얇고 희며, 맥은 침(沈)·지(遲)함. |
| 질병처방 |
계향산(桂香散)[2]
|
|
옥포두법(玉抱肚法)
|
|
침향마비산(沈香磨脾散)
|
|
후박온중탕(厚朴溫中湯)
|
 흉격비민(胸膈痞悶)
흉격비민(胸膈痞悶)
| 계통 |
토(吐)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가슴과 배 사이가 그득하고 답답한 증. 중초(中焦)에 습탁(濕濁)이 위를 막고 담응기체(痰凝氣滯)로 양기(陽氣)가 막혀 일어남. 마른 기침과 트림이 나고 괴로우나 아프지는 않음. |
| 질병처방 |
치시탕(梔豉湯)
|
 두부독(豆腐毒)
두부독(豆腐毒)
 면독(麵毒)
면독(麵毒)
 면적(麵積)
면적(麵積)
 비괴(痞塊)
비괴(痞塊)
 비신구허(脾腎俱虛)
비신구허(脾腎俱虛)
 수곡불화(水穀不化)
수곡불화(水穀不化)
 숙식(宿食)
숙식(宿食)
 위기불화(胃氣不和)
위기불화(胃氣不和)
 육적(肉積)
육적(肉積)
 음식불소(飮食不消)
음식불소(飮食不消)
 적리(積痢)
적리(積痢)
 치육중독(雉肉中毒)
치육중독(雉肉中毒)
 한복통(寒腹痛)
한복통(寒腹痛)
 흉격비민(胸膈痞悶)
흉격비민(胸膈痞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