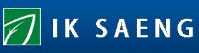익생원인과 증상
배탈이 나거나 하여 묽은 대변을 누는 증상. 사리(瀉痢)라고도 한다. 대변 누는 횟수가 잦고 변이 묽으며 심지어 맹물 같은 대변을 누기도 한다. 세균성 질환이나 식중독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이 심해져서 내용물이 충분히 소화 흡수되지 않은 채로 배설되는 증세를 가리킨다. 병원성 대장균 감염,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세균에 의한 감염, 아메바성 이질, 세균성 이질 등 세균성 설사는 반드시 원인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한다. 미열이 있고 입맛이 당기지 않으며 대변 횟수가 잦은 정도의 가벼운 설사는 음식의 양을 줄이면 되지만, 만약 고열과 구토·경련·호흡곤란·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심한 설사, 독성이 있는 설사는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 설사에도 순간적인 것과 만성적인 것이 있으며,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급성 : 독물이나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수습 방어를 위해 순간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성 : 장에서 오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있으며, 장에서 오는 원인에는 장궤양·장염·세균성 질환 등이 있다. 만성 질환 중에는 심인성(心因性)에 기인하는 것도 많은데, 그 증상은 때때로 배꼽 근처에서 꾸룩꾸룩하는 소리가 나며 아랫배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변형성 : 설사를 했다가 변비로 변했다가 다시 설사로 변하는 증상이다. 이 경우 식욕부진으로 영양실조가 오기도 하고 급성인 경우엔 탈수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
·계명사(鷄鳴瀉) : 결핵성·장염 등으로 주로 새벽에 오는 설사.
·담설(痰泄) : 담증(痰症)으로 인하여 생기는 설사. 수분 대사의 장애로 생긴 설사다. 때로 설사를 했다 멎었다 하며 심하게 설사를 하고 약간 설사하기도 하며 곱 같은 것을 눈다.
·당설(溏泄) : 배가 부르면서 복통이 따르는 설사. 한설(寒泄)
·산리(疝痢) : 냉으로 인한 하복통이 함께 오는 설사.
·손설(飧泄) : 소화가 안 되어 음식이 먹은 그대로 다 나와 버리는 설사
·신설(晨泄·腎泄) : 소화기 기능의 장애로 날마다 이른 새벽에 오는 설사.
·열리(熱痢) : 항문에 열 기운이 있는 설사.
·청곡(淸穀) : 소화불량성 설사.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멀건 물 같은 대변이 나온다.
·체설(滯泄) : 소화장애로 먹은 음식물이 체하여 일어나는 설사.
 구사(久瀉)
구사(久瀉)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구설(久泄). 오랜 설사. 원기하함(元氣下陷)으로 대장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비기(脾氣)가 허해 생김. 대변활설(大便滑泄), 탈항(脫肛), 흉복창만, 소변임력 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곡도(穀道)가 아물지 않아 구하기 어려움. |
| 질병처방 | 백초상(百草霜)[4] |
 구설(久泄)
구설(久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구사(久瀉). 오랫동안 설사하고 낫지 않는 증. 비기(脾氣)가 허하거나, 진음(眞陰)이 허손되어 생김. 비기가 허해 생기면 탈항(脫肛)하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배가 부르고, 소변이 잘 안 나옴. 진음허손으로 생기면 허리가 시큰거리고, 몹시 피로하며, 현훈(眩暈), 이명(耳鳴), 유정(遺精), 조설(早泄) 등이 따름. |
| 질병처방 | 가자산(訶子散)[2] |
|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2] | |
| 삼출건비환(蔘朮健脾丸) | |
| 온비산(溫脾散) | |
| 제습건비탕(除濕健脾湯) | |
| 후박기실탕(厚朴枳實湯) |
 담설(痰泄)
담설(痰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담사(痰瀉). 담적설사(痰積泄瀉). 담적(痰積)으로 일어나는 설사. 습(濕)이 쌓여 담(痰)이 되어 폐(肺)에 몰려 그 표리(表裏) 관계인 대장(大腸)에 영향을 끼쳐 발생함. 설사가 났다가 멎었다가 하고, 양도 많다가 적다가 하며, 계란 흰자위 같은 곱똥을 누고,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며, 입맛이 없고, 소변은 적고 붉으며, 맥은 현(弦)·삭(數)함. |
| 질병처방 | 만병이진탕(萬病二陳湯) |
| 해청환(海靑丸)[1] |
 당설(溏泄)
당설(溏泄)
| 계통 | 황달(黃疸)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1) 대변이 묽은 것. (2) 끈끈한 곱똥을 설사하는 것. 장위(腸胃)에 열이 있어 전화(傳化)가 잘 되지 않아 훈증되어 습사(濕邪)를 움직여 일어남. 소변이 황적색이고, 심번(心煩)이 있고, 발열하고, 입안이 마르고, 맥이 삭(數)함. |
| 참고 | 소문지진요대론(素問至眞要大論) |
| 질병처방 | 종용우슬탕(蓯蓉牛膝湯) |
| 퇴황환(退黃丸) |
 비설(脾泄)
비설(脾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운화기능이 장애되어 생긴 설사. 항상 배가 불러오르고 그득하면서, 쏟아붓듯이 설사함. 먹으면 곧 구토하고, 몸이 무겁고, 얼굴이 누렇고 윤기가 없음. |
| 질병처방 | 고중환(固中丸) |
| 산사국출환(山査麴朮丸) | |
| 오수유탕(吳茱萸湯)[1] | |
| 조중건비환(調中健脾丸) | |
|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1] |
 손설(飱泄)
손설(飱泄)
| 계통 | 유행병(流行病)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손사(飱瀉). 수곡리(水穀痢).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낱알 그대로 설사하는 것. 장위(腸胃)에 한사(寒邪)를 받아 일어남. 복명(腹鳴), 복통이 있고 맥은 현(弦)·완(緩)함. |
| 참고 | 영추사전편(靈樞師傳篇) |
| 질병처방 | 가감목향산(加減木香散) |
| 방풍작약탕(防風芍藥湯) | |
| 백출후박탕(白朮厚朴湯) | |
| 영출탕(苓朮湯)[1] | |
| 창출방풍탕(蒼朮防風湯) | |
| 팔선고(八仙糕) |
 수리(水痢)
수리(水痢)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물 같은 설사. 습사(濕瀉), 열사(熱瀉), 한사(寒瀉) 등에서 나타남. |
| 질병처방 | 마린자(馬藺子) |
 습설(濕泄)
습설(濕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유설(濡泄). 습사(濕瀉). 비경(脾經)이 습사(濕邪)를 받아 양기(陽氣)가 하함(下陷)하여 생긴 물 같은 설사.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없고, 구갈은 없고, 배는 아프지 않거나 약간 아프며, 소변이 적고 붉으며, 설태는 기름때 같고, 맥은 유(濡)·세(細)함. |
| 질병처방 | 국궁환(麴芎丸) |
| 만병오령산(萬病五苓散) | |
| 사습탕(瀉濕湯) | |
| 위령탕(胃苓湯)[1] | |
| 위생탕(衛生湯)[2] | |
| 위풍탕(胃風湯) | |
| 저간(猪肝)[1] |
 신설(腎泄)
신설(腎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오경설(五更泄). 신설(晨泄). 새벽에 설사하는 병증. 신원부족(腎元不足)으로 비위(脾胃)를 자양하지 못해 생김. 설사가 장기간 낫지 않으며, 새벽 4-6시에 장명(腸鳴)과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남. 얼굴빛이 까맣고, 오한이 나며, 혀의 색이 엷고, 설태는 희고, 맥은 침세(沈細)함. 이질과 비슷하나 이질은 아님. |
| 참고 |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
| 질병처방 | 목향산(木香散)[2] |
| 사신환(四神丸)[2] | |
| 삼신환(三神丸)[2] | |
| 오미자산(五味子散) | |
| 육신탕(六神湯) | |
| 이신환(二神丸)[1] | |
| 저장환(猪臟丸) | |
| 향강산(香薑散) |
 옹저설사(癰疽泄瀉)
옹저설사(癰疽泄瀉)
| 계통 | 옹저(癰疽)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옹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질이 한량(寒凉)한 약을 지나치게 먹어 위경(胃經)이 한사(寒邪)에 상하거나, 오랫동안 옹저를 앓느라 비위기허(脾胃氣虛)로 소화가 안되어 일어나는 설사. |
| 질병처방 | 탁리온중탕(托裏溫中湯) |
 자리(子痢)
자리(子痢)
| 계통 | 부인(婦人)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임신부의 이질. 출산하면 즉시 멎음. 비위(脾胃)가 허약하거나, 생랭물(生冷物)에 상하여 일어남. 하리복통(下痢腹痛)이 있고 간혹 중추감(重墜感)이나 태기불안(胎氣不安)을 느낌. |
| 질병처방 | 가출산(訶朮散) |
| 계황산(鷄黃散) | |
| 당귀작약탕(當歸芍藥湯)[2] | |
| 대녕산(大寧散) | |
| 백출탕(白朮湯)[3] | |
| 압자전(鴨子煎) |
 자리(自利)
자리(自利)
| 계통 | 화(火)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1) 하약(下藥)을 쓰지 않고 저절로 설사하는 것. (2) 소변이 잘 나오는 것. |
| 질병처방 | 기제탕(旣濟湯)[1] |
| 삼유환(蔘萸丸) |
 장허설리(腸虛泄痢)
장허설리(腸虛泄痢)
| 계통 | 대장(大腸)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대장의 기허(氣虛)로 일어나는 설사. 비허(脾虛)의 증후를 겸하며, 장기간에 걸쳐 소화되지 않은 변을 설사하는데 냄새는 없고, 장명(腸鳴)이 따름. 임상에서 한증(寒證)을 겸할 때가 많음. |
| 질병처방 | 오배자(五倍子)[1] |
| 오배자(五倍子)[2] |
 주설(酒泄)
주설(酒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주상(酒傷)으로 나는 설사. 과음으로 습(濕)이 머물러 비(脾)를 손상해 생김. 아침에 일어나면 설사가 나고 때로 피가 나오기도 함. 몹시 야위고, 입맛이 없고, 묽은 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보고, 술을 마시면 더 심해져 잘 낫지 않음. |
| 질병처방 | 향용환(香茸丸) |
 통설(洞泄)
통설(洞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음식을 먹으면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고 곧바로 삭지 않은 변을 설사하는 것. 한기(寒氣)가 뱃속에 있어서 생김. |
| 질병처방 | 산석류각(酸石榴殼) |
 폭설(暴泄)
폭설(暴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폭사(暴瀉). 돌연 발생한 설사. 열이 대장에 몰려서 생김. 물같은 설사에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고, 소변 회수도 많으며, 그 증상이 급박함. |
| 참고 | 소문지진요대론(素問至眞要大論) |
| 질병처방 | 백초상(百草霜)[3] |
| 장수산(漿水散) | |
| 조진단(朝眞丹) |
 허설(虛泄)
허설(虛泄)
| 계통 | 대변(大便)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허사(虛瀉). 맥이 미약하면서 설사가 나는 것. 몸이 약하거나, 비신(脾腎)의 양기(陽氣)가 허해서 생김. |
| 참고 | 소문옥판론요편(素問玉版論要篇) |
| 질병처방 | 가미사군자탕(加味四君子湯)[1] |
| 삼령연출산(蔘苓蓮朮散) | |
| 승양제습탕(升陽除濕湯)[2] | |
| 양원산(養元散) |
 활설(滑泄)
활설(滑泄)
| 계통 | 소아(小兒)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먹기만 하면 설사가 나는 것. 오랜 설사로 중초(中焦)의 기가 약해졌거나, 비위(脾胃)가 한사(寒邪)를 감수했거나, 하약(下藥)을 잘못 먹은 데에 다시 유행성 한사를 감수하여 생김. 신(腎)과 비위가 모두 허하면 심위(心胃)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그치지 않음. 비와 신의 기혈이 모두 허하면 대변활리(大便滑利), 소변폐삽(小便閉澁), 지체점종(肢體漸腫), 해수다담(咳嗽多痰) 등이 나타남. 비위가 허약한 데에 속에서 풍랭(風冷)을 끼면 음식이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을 쏟아 붓는 듯이 설사하고,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며, 뱃속에서 뇌명(雷鳴)이 있음. |
| 질병처방 | 가미출부탕(加味朮附湯)[2] |
| 만전환(萬全丸) | |
| 목향산(木香散)[1] | |
| 실장산(實腸散)[2] | |
| 우여량환(禹餘粮丸) | |
| 팔주산(八柱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