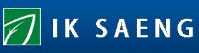익생원인과 증상
간 조직에 염증이 생겨 간 세포가 파괴되어 일으키는 카타르성 황달을 말한다. 주로 간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다른 장에도 병변을 초래하는 전신 질환이다. 발생 원인에 따라 중독성간염, 바이러스성간염, 자가면역성간염으로 나뉘고, 진행 과정에 따라 급성과 만성간염으로 분류한다. 간염 바이러스는 A형·B형·C형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B형간염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 간염은 1년 4계절 어느 때나 발생하나 특히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하다. 우리나라에서 만성간염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B·C형이다. 특히 만성간염은 증상이 가벼울 경우 진행이 원만하지만, 심할 경우 반복적인 염증의 결과로 간이 울퉁불퉁해져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
**A형간염
장내(腸內) 바이러스에 속하는 A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급성간염. 경구감염에 의하여 대변에 섞여 배설된 바이러스가 다시 입을 통해 전파된다. 증세는 A·B·C형이 기본적으로 같아서 초기에는 두통·인두통(咽頭痛)·발열·식욕부진·메스꺼움·구토·전신권태 등을 느끼게 된다. 뒤이어 눈동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오줌의 색깔이 진해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두 달이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A형간염은 쉽게 치유가 되고 만성화되는 일이 없다.
**B형간염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간염. 수혈성황달이라고도 한다. 증상은 A형간염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5~8%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로 출산 전후 또는 신생아기에 전염되는 것이 중요한 감염 경로이다. 이를 수직감염(垂直感染)이라 한다. 성인은 성교나 수혈을 통해 감염되는 일과성감염의 경과를 거치지만, 신생아나 소아는 지속적으로 감염되는 일이 많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출산 전후에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감염 위험이 높다. 이 밖에 부모 자식간의 관계처럼 긴밀한 접촉, 성 관계,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사 바늘 등에 찔렸을 경우 등에서 B형 환자의 혈액·정액·타액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
**C형간염
‘비(非)A, 비(非)B형’ 간염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C형 바이러스는 그 일종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비경구적(非經口的)인 경로로 전염된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 바늘이 문제가 되며 수혈, 오염된 혈액 제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급성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진행됐을 경우 발생한다.
(1) 혈청간염(血淸肝炎) : 수혈이나 주사기 등으로 감염된다. B, C형이 이에 속하는데, 주로 C형이고 B형이 10%쯤 된다.
(2) 유행성간염(流行性肝炎) : 찻잔·술잔·음식물·식기 또는 환자의 배설물 등에 의해서 감염된다. A형간염이 이에 속한다.
(3) 급성간염(急性肝炎) : 바이러스나 약물 등에 의한 간의 급성 염증으로 보통 3~6개월 이내에 치유된다. 급격하게 간 세포의 넓은 부위에 괴사가 생겨 급격하게 간 부전이 일어난다. 대부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가장 빠른 증상으로 급격한 의식장애를 보인다. 동시에 온몸에 출혈이 생기는 현상도 일어난다.
(4) 만성간염(慢性肝炎) : 간염 중 급성에 비하여 경과가 오래 걸리며 6개월 이상에 걸쳐 간염의 증상과 간 기능의 장애 등 간 조직에 염증이 계속되어 간 세포에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기울결(肝氣鬱結)
간기울결(肝氣鬱結)
| 계통 | 간장(肝臟) / 내경편(內景篇) |
| 원인과 증상 | 간기가 몰려서 생긴 병증. 칠정(七情)이나 그외 원인으로 간의 소설기능이 장애받아 생김. 양 옆구리가 그득하고 뻐근하면서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며, 월경이 불순하고, 유방이 불어나고 아프며, 우울하고 화를 잘 내며, 두통 및 심번(心煩)이 있고, 한숨을 쉬고, 신트림이 나고, 설사하며, 식욕이 없음. |
| 질병처방 | 사청환(瀉靑丸)[1] |
 습열(濕熱)
습열(濕熱)
| 계통 | 하(下)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습사(濕邪)와 열사(熱邪)가 합한 병증. 습열발황(濕熱發黃), 습열역(濕熱疫), 습열대하(濕熱帶下) 등. 내열(內熱)이 막아 수도(水道)를 선행(宣行)하지 못하고 정체(停滯)하여 습이 생김. 허약한 사람에게 많음. 소변적삽(小便赤澁), 인음자한(引飮自汗), 혹은 오심번열(五心煩熱)이 있을 수 있으며 설태는 황니(黃膩)하고 맥은 활삭(滑數)함. 수종과 소변불리(小便不利)가 있으면 속에 습이 있기 때문임. 때때로 유정(遺精)이 있거나, 지절견배(肢節肩背)가 침중(沈重)하고 동통이 있거나, 온 몸이 아프기도 함. |
| 질병처방 | 금화산(金華散)[1] |
| 단창출환(單蒼朮丸) | |
| 통격환(通膈丸) |
 습열황달(濕熱黃疸)
습열황달(濕熱黃疸)
| 계통 | 황달(黃疸)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습열발황(濕熱發黃). 양황(陽黃)의 하나. 주로 습열이 간담경(肝膽經)에서 서로 뭉쳐 쌓였다가 일어남. 신열(身熱), 번갈(煩渴), 간혹 번조(煩躁) 등이 따름. 열이 우세하면 황달색이 선명하고 발열, 구고(口苦), 구건(口乾), 소곡선기(消穀善飢), 간혹 소변열통적삽(小便熱痛赤澁) 외에 대변비삽(大便秘澁), 복창(腹脹), 때로 심번(心煩), 오심, 구토 등이 있음. 습이 우세하면 황달색이 어둡고, 몸이 무겁고, 배가 그득하고, 입맛이 없고, 대변이 묽음. |
| 질병처방 | 만청자(蔓菁子)[7] |
| 복령삼습탕(茯苓渗濕湯) | |
| 인진오령산(茵蔯五苓散) |
 습온(濕溫)
습온(濕溫)
| 계통 | 온역(瘟疫)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신감온병의 하나.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열성병(熱性病). 이미 습에 상한 데에 다시 서사(暑邪)를 감수하거나, 또는 이미 서사를 감수했는데 다시 습에 상해 습과 서사가 서로 뭉쳐 일어남. 습이 표(表)에 있으면 오한, 무한(無汗), 지속적인 발열, 신중(身重) 등이 나타남. 습이 기육(肌肉)에 있으면 오한, 발열, 신중, 관절동통 등이 있음. 특징은 병의 경과가 길고 병세가 좀처럼 약해지지 않으며, 병변이 대개 기분(氣分)에 머문다는 것임. 습이 열보다 중한 경우와, 열이 습보다 중한 경우로 나뉨. 병상이 더 진행되어 영분(營分)과 혈분(血分)으로 들어가면 경궐(痙厥), 변혈(便血) 등이 나타남. |
| 참고 | 병인맥경(病因脈經) |
| 질병처방 | 별육(鼈肉) |
| 복령백출탕(茯苓白朮湯) | |
| 성산자(聖散子) | |
| 영출탕(苓朮湯)[2] |
 천행급황(天行急黃)
천행급황(天行急黃)
| 계통 | 황달(黃疸) / 잡병편(雜病篇) |
| 원인과 증상 | 급황(急黃). 역려(疫癘). 전염성 황달. 비위(脾胃)에 본래 축열(蓄熱)이 있는 데에 곡기(穀氣)가 울증(鬱證)하고 객기열독(客氣熱毒)이 보태어져 일어남. 몸과 눈에 황달이 오지만 황달인 줄 알지 못함. 가슴이 그득하고 기천(氣喘)하여 위험이 경각에 있음. |
| 질병처방 | 웅담(熊膽)[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