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자나무
이명
대조협(大皁莢)
장조협(長皁莢)
조각(皁角)
| 분포 |
전남, 경북, 충북 |
채취기간 |
10월(열매), 가을~이듬해 봄(나무껍질) |
| 키 |
10~15m |
취급요령 |
햇볕에 말려 쓴다. |
| 생지 |
산야나 개울가 또는 재배 |
성미 |
따뜻하며, 맵다. |
| 분류 |
낙엽 활엽 교목 |
독성여부 |
없다. |
| 번식 |
꺾꽂이ㆍ씨 |
1회사용량 |
6~8g |
| 약효 |
열매ㆍ나무껍질 |
사용범위 |
치유되는대로 중단한다. |
잎
어긋나며 3~6쌍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이다. 작은 잎은 길이 1~9cm, 나비 5~35mm의 긴 타원형 또는 댓잎피침형으로서 양 끝이 둔하거나 약간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둔한 톱니가 있다. 앞면의 주맥과 맥 위에 갈색 털이 약간 있으며 뒷면에는 맥 위에만 갈색 털이 약간 있다.
꽃
6월에 엷은 황백색 꽃이 총상 꽃차례를 이루며 달려 핀다. 양성화이다.
열매
10월에 길이 20cm, 나비 3cm쯤 되는 두꺼운 협과가 달려 익는데 꼬투리는 편평하고 비틀리지 않으며 쪼개면 매운 냄새가 난다.
특징 및 사용
조각자(皁角刺)ㆍ조협(皁莢)이라고도 한다. 조각자란 가시가 뿔처럼 달려 있는 모양을 의미하며 조협은 콩깍지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생긴 별칭이다. 주엽나무와 비슷하지만 가시가 굵고 그 단면이 둥글며 꼬투리가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는 점이 다르다. 가시는 큰 것이 길이 10cm, 지름 1cm 이상이며 방추형 비슷하다. 중부 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 가시를 조각자, 열매를 조협, 씨를 조협자(皁莢子), 뿌리껍질을 조협근피(皁莢根皮)라 한다. 관상용ㆍ약용으로 이용된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여 사용한다. 외상에는 짓이겨 붙인다.
익생양술 효능
주로 운동계 질환과 풍증을 다스린다.
 저아조각(猪牙皂角) / 조각자나무
저아조각(猪牙皂角) / 조각자나무
 조각(皂角) / 조각나무
조각(皂角) / 조각나무
| 라틴명 |
Gleditsiae Fructus |
| 약재의 효능 |
수풍궤견(搜風潰堅)
(내풍(內風)을 제거하고, 딱딱하게 뭉친 것을 제거하는 효능임)
|
|
사간(瀉肝)
(청법(淸法)의 하나. 고한(苦寒)한 약물을 사용하여 간화(肝火)를 청설하는 방법임.)
|
|
이폐(利肺)
(폐(肺)를 이롭게 하는 효능임)
|
|
명목(明目)
(눈을 밝게 하는 효능임)
|
|
살충(殺蟲)
(기생충을 없애는 효능임)
|
|
개위(開胃)
(위(胃)를 열어주는 효능임)
|
|
익정(益精)
(정기(精氣)를 보익(補益)하는 효능임)
|
|
소담(消痰)
(막혀 있는 탁한 담(痰)을 쳐 내리는 거담(祛痰) 방법임.)
|
|
화식(化食)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효능임)
|
|
발독(拔毒)
|
|
벽온역사기(辟溫疫邪氣)
(온역(溫疫)을 일으키는 사기(邪氣)를 피하게 하는 효능임.)
|
|
통규수풍(通竅搜風)
(구규(九竅)를 막히지 않게 소통시키고 풍을 막는 효능임)
|
| 작용부위 |
대장(大腸)
, 폐(肺)
|
| 성미 |
소독(小毒)
, 신(辛)
, 온(溫)
|
| 약재사용처방 |
가감궁신탕(加減芎辛湯) /
두풍(頭風)
|
|
개결기실환(開結枳實丸) /
담음(痰飮)
, 기체(氣滯)
|
|
만응환(萬應丸)[2] /
적취(積聚)
|
|
목향빈랑환(木香檳榔丸)[4] /
곡창(穀脹)
, 기창(氣脹)
|
|
밀조환(蜜皂丸)[1] /
두창대변비결(痘瘡大便秘結)
|
|
밀조환(蜜皂丸)[2] /
두창대변비결(痘瘡大便秘結)
|
|
박하단(薄荷丹) /
나력(瘰癧)
|
|
복령탕(茯苓湯)[2] /
천포창(天疱瘡)
, 양매창(楊梅瘡)
|
|
비기환(肥氣丸) /
간적(肝積)
|
|
사생환(四生丸)[2] /
담화(痰火)
, 적열(積熱)
|
|
삼신환(三神丸)[3] /
치(痔)
|
|
선열단(宣熱丹) /
풍열(風熱)
, 나력(瘰癧)
|
|
선화무비산(蟬花無比散) /
풍견편시(風牽偏視)
|
|
소나조환(小蘿皂丸) /
구천(久喘)
|
|
소서각환(小犀角丸) /
나력(瘰癧)
|
|
소풍순기탕(疏風順氣湯) /
반신불수(半身不遂)
, 중풍(中風)
|
|
소풍화담탕(疏風化痰湯) /
나력(瘰癧)
|
|
신선추담원(神仙墜痰元) /
담음(痰飮)
|
|
신이고(神異膏)[2] /
개선(疥癬)
|
|
오선고(五仙膏) /
적취(積聚)
, 비괴(痞塊)
|
|
오선환(五仙丸) /
제충(諸蟲)
|
|
옥용산(玉容散) /
면상잡병(面上雜病)
|
|
옥용서시산(玉容西施散) /
흑염정(黑靨疔)
, 풍자(風刺)
|
|
우선단(遇仙丹)[1] /
충적(蟲積)
|
|
웅황환(雄黃丸)[2] /
정창(釘瘡)
, 악창(惡瘡)
|
|
입정산(立定散) /
효천(哮喘)
|
|
전진환(全眞丸)[1] /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 삼초옹체(三焦壅滯)
|
|
정양산(正陽散)[2] /
상한음독(傷寒陰毒)
|
|
조각(皂角)[1] /
비색(鼻塞)
|
|
조각산(皂角散) /
졸중풍(卒中風)
, 담색(痰塞)
|
|
증손오적환(增損五積丸)[1] /
오적(五積)
, 비적(脾積)
|
|
천민도담탕(千緡導痰湯) /
담천(痰喘)
|
|
천민탕(千緡湯) /
담천(痰喘)
|
|
청금환(淸金丸)[3] /
효천(哮喘)
|
|
초오산(草烏散) /
골절(骨折)
|
|
추충환(追蟲丸) /
충적(蟲積)
|
|
축비통천산(縮鼻通天散) /
졸중풍(卒中風)
|
|
치주피추창일방(治走皮皺瘡一方)[2] /
주피추창(走皮趨瘡)
|
|
탈명산(奪命散)[1] /
급후비(急喉痺)
, 전후풍(纏喉風)
|
|
통관산(通關散)[2] /
졸중풍(卒中風)
|
|
통관산(通關散)[3] /
졸중풍(卒中風)
|
|
희연산(稀涎散)[2] /
풍연색후(風涎塞喉)
|
 조각수근피(皂角樹根皮) / 조각자나무 뿌리 껍질
조각수근피(皂角樹根皮) / 조각자나무 뿌리 껍질
| 라틴명 |
Gleditsiae Radicis Cortex |
| 약재의 효능 |
개규(開竅)
(사기(邪氣)가 심규(心竅)를 막아 정신이 혼미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열을 꺼주거나 담(痰)을 없애거나 한(寒)을 없애서 치료함)
|
|
통리(通利)
(대소변을 통하게 하는 효능임.)
|
|
제풍(除風)
(풍(風)의 기운을 제거하는 효능임)
|
|
해독(解毒)
(독성(毒性)을 풀어주는 효능임)
|
|
살충(殺蟲)
(기생충을 없애는 효능임)
|
| 성미 |
신(辛)
, 온(溫)
|
| 약재사용처방 |
조근환(皂根丸) /
완선(頑癬)
, 양매창(楊梅瘡)
|
 조각인(皂角仁) / 조각자나무 씨
조각인(皂角仁) / 조각자나무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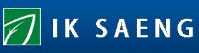

 익생양술에서 "조각자나무"로 처방에 사용되었음.
익생양술에서 "조각자나무"로 처방에 사용되었음.
